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들이 ‘탈(脫)통신’을 외친 것과 달리, 매출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은 최저 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3사 독점 구도인 통신사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새 먹거리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말로만 탈통신을 공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들은 업종 특성상 망 구축 등을 위한 설비투자비(CAPEX)와 마케팅에 큰 비용이 쏠려있어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효과’라고 설명한다.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CAPEX 집행 비중을 보면 20~3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통신업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로, 탈통신의 연장선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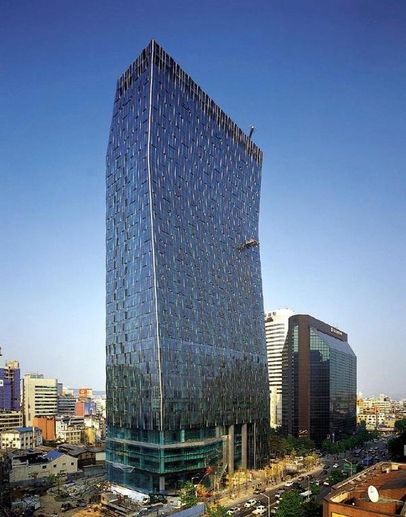
◇ 탈통신 외친지 10년 넘었는데…R&D 투자 ‘뒷걸음질’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올해 1분기 R&D 비용으로 51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575억원)보다 11.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 대비 R&D 비중은 0.67%로, 전년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KT의 매출 대비 R&D 비중은 2014년 2.57%를 정점으로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5년 1.25%로, 전년 대비 반 토막 난 데 이어 2017년 0.72%로 주저앉았다. 이후 지속해서 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 추세라면 올해 역시 감소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R&D에 1033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19억원) 대비 7.68% 줄어든 것이다.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은 2.52%에서 2.16%로, 0.36%포인트 감소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은 2% 안팎을 유지 중이다. 2011년(1.85%)과 2015년(1.88%)을 제외하고는 2% 초반의 비중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2011년을 기점으로 3년은 비중을 늘린 후 다음 해에 줄이고 다시 3년은 확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LG유플러스의 매출 대비 R&D 비중은 줄곧 ‘0%대’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0.42%로 전년(0.40%)보다 소폭 올랐다. 1분기 기준 금액으로는 189억원이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매출 대비 R&D 비중이 1%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은 높았던 것은 2012년 0.7%다. 이후 0.4~0.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4년 연속 0.4%대다.
통신사들은 10년 전부터 ‘탈통신’을 외치며 새 먹거리 창출을 공언해왔다. KT는 정보기술(IT) 서비스 기반의 ‘S.M.ART’, SK텔레콤은 ‘산업 생산성 증대(IPE)’을 내세웠다. 국내 통신 3사 중 매출 대비 가장 적은 R&D 비중을 보인 LG유플러스는 통신업의 상징인 ‘텔레콤’을 사명에서 지워버리기도 했다.

◇ 통신업계 ”설비투자, 고려해야 착시효과”…설비투자액은 통신업 투자
국내 통신사들은 “망 사업자다 보니 설비 투자를 비롯,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R&D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국내 통신업계가 쏟아붓는 설비투자비(CAPEX)는 연간 7조~8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역시 국내 통신 3사는 이 같은 규모의 설비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CAPEX에 투입된 비용이 사실상 R&D 비용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통신업계에서 나온다. 국내 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11조7466억원)을 고려하면 CAPEX 비중은 약 20%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로 꼽히는 네이버의 지난해 기준 매출 대비 R&D 비중(25%)과 맞먹는 수준이다. 다만 절대적 금액만 놓고 보면 SK텔레콤은 4000억원대 수준으로, 1조원이 넘는 네이버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LG유플러스와는 10배 이상 격차다.

최근 들어 3년 동안의 통신사 CAPEX 규모를 보면 줄거나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SK텔레콤와 KT는 올해 CAPEX 가이던스(목표치)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SK텔레콤은 2조2053억원, KT는 2조8700억원을 지출한 바 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각각 24.48%, 11.88% 감소한 것으로 모두 두 자릿수나 빠졌다. 이에 따라 올해 전년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규모를 늘리지는 않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 역시 올해 CAPEX 가이던스로 2조2000억원을 제시했는데, 지난해 제시한 2조5000억원과 비교해 12% 줄었다.
통신사들은 5세대 이동통신(5G) 세계 최초 상용화 첫해였던 2019년 네트워크 집중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를 CAPEX 감소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5G 초기였던 만큼 설비 투자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2020년 CAPEX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사들이 외친 탈통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국내 통신사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외부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등 협업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이 같은 형태도 일종의 R&D 투자로 볼 수 있다”면서도 “통상의 제조업과 달리 신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 대비 R&D 비중은 적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